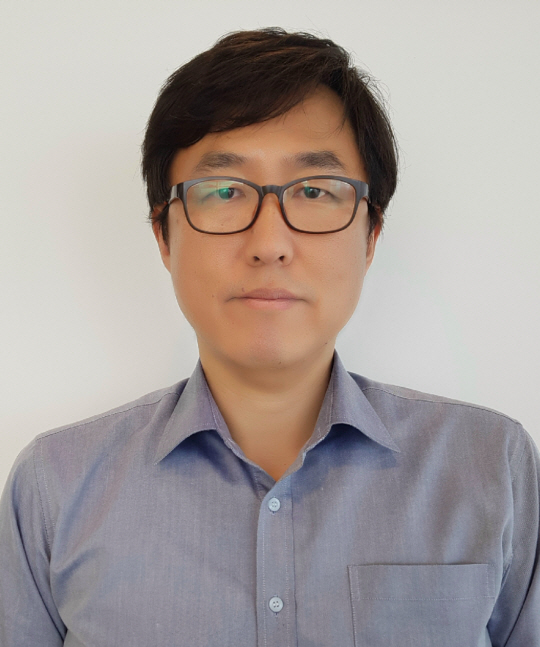
|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
고위 공직자들은 계열사가 가진 특정 주식을 팔라고 하거나, 총수는 비상장사나 비주력 기업의 지분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국회에는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20개 중 18개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고 단 2개만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올 4월말 기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일정 지분(예: 발행주식 1%)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에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렇게 얻은 의결권을 주주가 원하는 이사에게 몰아서 투표해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확실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기업이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의무시행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현행 주총에서 1차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던 것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일반 이사와 분리하여 주총에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는 의결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3%까지만 행사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입 목적은 선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해외에서 부작용이 커서 폐지했거나 주요국 중 시행하는 곳이 없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정도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과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주주총회가 주주간 표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기업 경영에 혼란이 커지자 1974년 상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폐지했다.
미국도 과거 대다수 주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으나 단기 투기 자본에 의한 폐해가 극심하여 현재 극소수의 주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미국, 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 후 가능한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 중 일본이 유일하게 도입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서 법인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시행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소수주주 보호보다는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 소수주주는 사실 의결권 행사에는 무관심하다. 의결권 행사보다는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또는 배당에 더 관심이 크다. 결국은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2대, 3대 주주와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나 엘리엇과 같은 다국적 단기투기 자본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엘리엇은 텔레콤 이탈리아(Telecom Italia)의 소수 지분을 취득한 후 다른 투자자들과 연합했고 약 24%의 지분을 가진 프랑스계 대주주인 비벙디(Vivendi)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친 후 이사회를 장악했다. 만일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지분을 확보한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엘리엇이 현대차에 집중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해외 투기자본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과도한 배당확대 요구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훼손시키고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대해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했고,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 그리고 순이익의 50%를 배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거래를 통해 4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ISD 소송에 승소한다면 총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규제강화 일변도인 기업지배구조 논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만일 소수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동시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은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터키, 홍콩, 대만 등 많은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이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운다면 성실한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하는 원칙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판례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오래전부터 법제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특혜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세상에는 100% 좋은 제도, 100% 나쁜 제도는 없다. 모든 제도는 도입에 따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만일 실이 득보다 크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포기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정치적 논리보다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